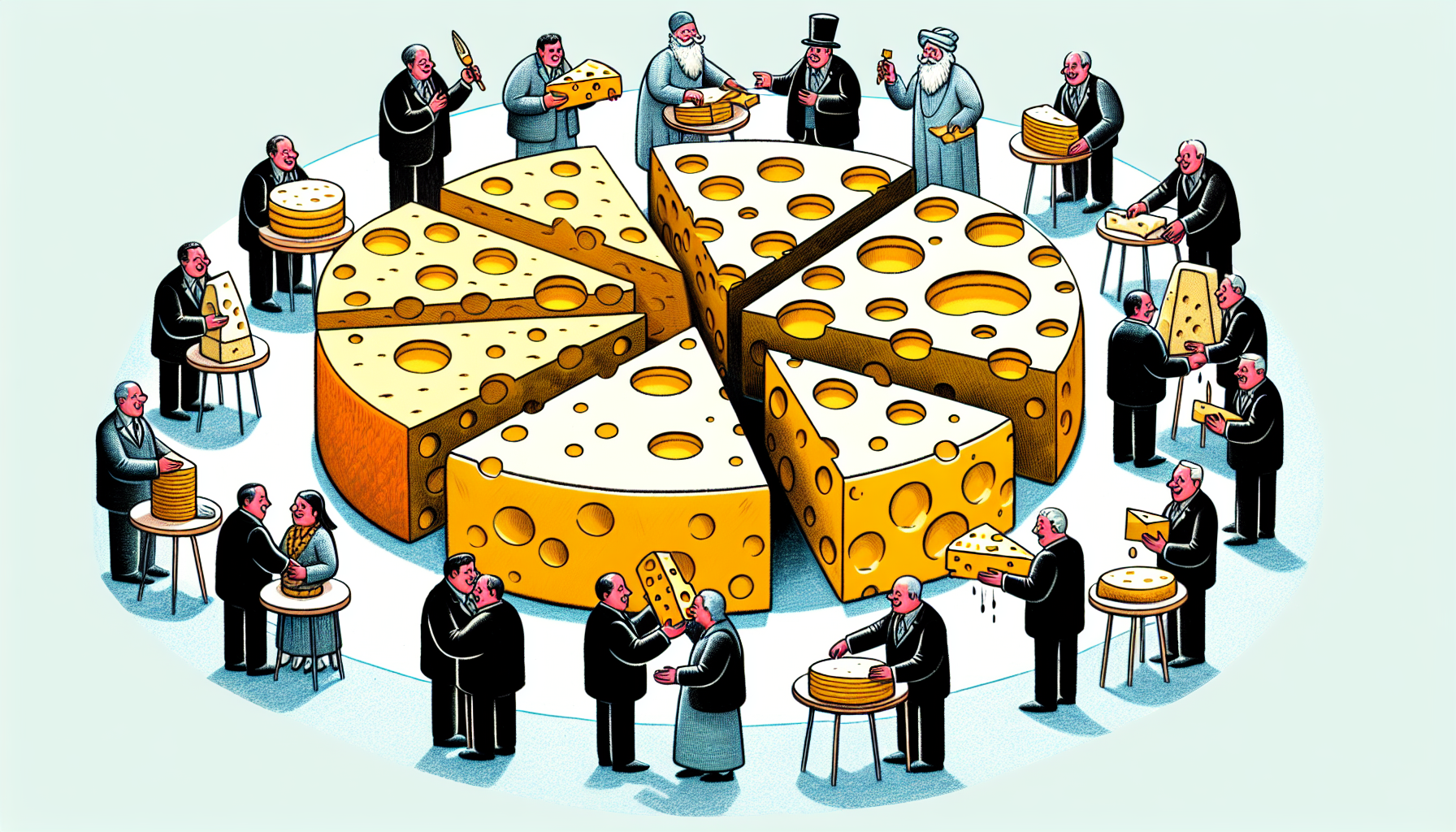📌 목차 바로가기
- 이것은 M&A 시장에 대한 농담 섞인 이야기다
- 유럽산 치즈는 어떻게 한국 직장인의 교훈이 되었나
-
첫째, 치즈 회사를 산 이유는 '낭만'이 아니다
-
둘째, 라탈리스처럼 사는 법
-
셋째, 한국 스타트업은 왜 ‘팔기 전까지’ 성공이 아닌가
- 마무리하며: "치즈는 열심히 발효 중입니다"
이것은 M&A(인수합병) 시장에 대한 에세이형 블로그 글이다.
정확한 회계 장부나 딜리전스를 뒤져 쓴 리포트는 아니고,
치즈 한 입 먹다가 떠오른 기업사냥 이야기니까,
진지한 독자들은 이쯤에서 페이지만 닫아주셔도 좋겠다.
유럽산 치즈는 어떻게 한국 직장인의 교훈이 되었나
2025년 5월, 프랑스의 유제품 공룡 '라탈리스(Lactalis)'가
포르투갈의 지역 치즈 기업 ‘케이조스 타바레스(Queijos Tavares)’를 인수했다.
바로 리스본 기반 투자사인 Crest Capital이 들고 있던 회사를
‘슬쩍’ 집어넣은 것이다.
이 얘기만 들으면 흔한 고급 식자재 시장 확대 전략처럼 보인다.
소는 프랑스에서, 치즈는 포르투갈에서 만들고,
맛은 세계적으로 팔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이번 M&A가 한국 직장인, 특히 어깨에 짐을 이고 있는 30~40대 직장인들에게
절묘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치즈 회사를 산 이유는 '낭만'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다.
"왜 라탈리스는 치즈 회사를 또 샀을까?"
이들은 원래부터 유럽 전역의 유제품 회사를 모으는 걸 생업처럼 하는 회사다.
작년엔 또 다른 포르투갈 업체 ‘세게이라 앤 세게이라’를 샀고,
미국에선 일반 밀크 요거트 브랜드인 요플레(Yoplait)를 통째로 삼켰다.
이쯤 되면, 그냥 치즈 맛집 수집 덕후냐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특정 지역의 생산시설, 즉 공장 두 곳을 더 얻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즉, '브랜드 = 감성'이 아니라,
'공장 = 캐시카우' 라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복기한 것뿐이다.
요즘 한국 스타트업계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다.
"OO 페이, 유저는 '천만'인데 수익은 '억만'"
즉 감성 브랜딩은 많은데, 정작 돈은 안 번다는 말이다.
그런데 라탈리스는 다르다.
공장부터 감에 안고, 수익이 나는 구조에서 브랜드를 더 씌운다.
화려한 브랜딩은 그 다음의 문제다.
이쯤이면 진짜 강력한 교훈이 나온다.
🧀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브랜드보다 공장을 사라.”
둘째, 라탈리스처럼 사는 법
M&A를 단순히 ‘기업을 사고파는’ 기술로 보면,
언제나 실패하고 만다.
왜냐하면 M&A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 확신 (이 분야 계속 성장할 거야)
- 운영력 (인수한 뒤에 당장 돌릴 수 있을 능력)
- 자금 (말 그대로 현금)
요즘 한국에서 스타트업들이 대기업에게 회사를 잘 못 파는 이유는 1, 2, 3 중 하나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반대로 라탈리스는 이 세 가지를 고루 갖췄다.
- 유럽 치즈 시장은 그 ‘슬로우 그로스’가 보장된 안정기
- 이미 4개의 생산시설 있고 운영 노하우는 깊다
- 연 매출 30조 원의 회사, 가지고 있는 유동성도 무시무시하다
사실 우리가 보면 "어? 포르투갈 치즈?" 할 수 있지만,
이 시장 안에서는 ‘어제 마트에서 본 치즈’가 곧 ‘금광’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한국 스타트업은 왜 ‘팔기 전까지’ 성공이 아닌가
한국은 이상하게도 회사가 커지면 거의 IPO(상장)밖에 답이 없다.
혹은 알 수 없는 PE(사모펀드)로 넘기거나.
“우리도 엑싯했다!”고 떠들지만, 실제론 ‘구조조정’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반면 유럽의 식품 기업들은 진짜 ‘살기 위해’ 회사를 판다.
투자사가 키운 회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매각 전략을 짠다.
타깃은 전략적 투자자, 즉 ‘같은 업종의 진짜 전문가’에게 판다는 점이다.
즉 팔기 위해 키운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장을 이룬 뒤, 더 키울 수 있는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다.
한국의 많은 창업자들은 회사 매각을 실패나 탈출로 여기지만,
라탈리스 같은 곳에서는 매각이 ‘성공의 완결’이다.
성장 → 인수인계 → 확장
이라는 아주 교과서적인 성공 사이클이 돌아가고 있다.
실제로 ‘케이조스 타바레스’는 포르투갈에서 꽤 근본 있는 회사였다.
공장도 둘이나 운영하고, 브랜드도 4개나 보유했다.
그런데 크레스트 캐피털이 가진 한계는 분명했다.
더 확장하려면 유통, 생산, 브랜드 마케팅까지 통합될 전략 파트너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딱 맞았던 게 라탈리스였다.
🔁 한국에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드문 이유?
대부분은 창업자가 회사와의 이별을 준비하지 않는다.
종종, 준비 안 된 엑싯은 ‘쌍방 고통’이 될 수 있다.
마무리하며: "치즈는 열심히 발효 중입니다"
라탈리스는 한 끼 식사처럼 회사를 삼키지 않는다.
느리지만 꾸준히, 고르게 확장한다.
생산시설이 늘어나고, 사람도 따라오며,
당장은 소리소문없이, 그러나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우리가 이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브랜드 외형보다는 ‘돌릴 수 있는 생산기반’을 갖추는 게
돈을 버는 가장 단단한 길이라는 것이다.
한국식 스타트업과 유럽형 인수합병의 차이,
사실은 치즈 하나에도 그대로 배어 있다.
📎 한줄 요약:
“성공은 자산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인수할 수 있는 구조로 완성된다.”
—
🧀 오늘의 교훈:
치즈 회사도, 사람도, 결국 ‘누가 어떻게 돌리느냐’가 답이다.
결국, 맛이 나는 곳엔 이유가 있다.